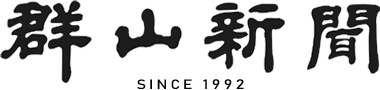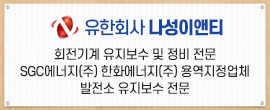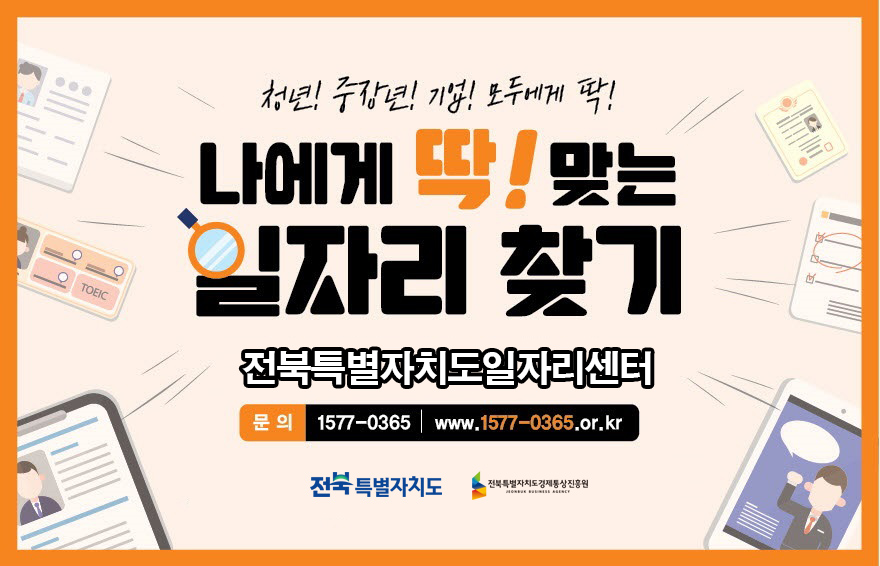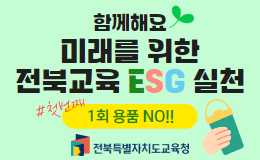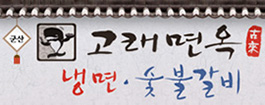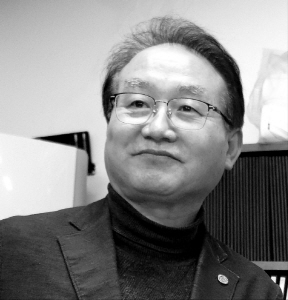
“왜 어떤 도시는 사람을 살게 만들고, 어떤 도시는 사람을 떠나게 만들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머무는 도시, 즉 사회적 시스템이 시민 개인의 가능성과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베스트셀러《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부(富)에 대한 두 가지 사고방식을 비교합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철학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예산을 ‘소비’하지만, 어떤 도시는 예산을 ‘투자’합니다. 어떤 도시는 시민을 의존하게 만들고, 어떤 도시는 시민을 자신감과 자립심을 갖게 만듭니다. ‘부자 시민’이란 단순히 소득이 높은 시민이 아닙니다.
자산이 많은 시민입니다. 그 자산은 곧 도시가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창업의 기회, 풍부한 문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도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민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기회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자체장의 역할입니다. 지자체장은 도시의 단순한 운영자가 아닙니다. <도시의 ‘부자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시민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려는 중장기적인 전략목표와 시간별 실행목표에 기반을 둔 발전계획에 담아서 청렴하고 책임감 있게 시정을 경영해야 합니다.
가난한 아빠가 자녀에게 안정된 직장을 강조했다면, 부자 아빠는 자녀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도시는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청년 창업을 유치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활력을 얻었습니다. 도시를 위한 돈의 쓰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민간수요의 창출과 도시자산을 강화하는 투자에 가까워야 하며,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도시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순환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합니다. “우리 도시는 돈이 도시를 위해 일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자체장은 부자 아빠처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지자체장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닌 희망 설계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시민이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꾼다면, 도시의 지자체장과 의회는 ‘기회 걱정 없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부자 시민이 성장하는 도시, 그것은 결국 부자 도시를 만드는 리더십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