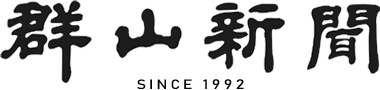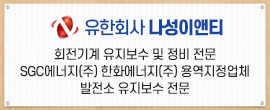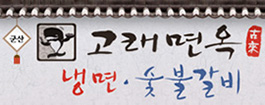◇진희완 도시·지방 정책연구소 소장(제7대 군산시의회 의장)
AI 시대의 물결은 이미 전 세계를 뒤덮었다. ChatGPT의 등장 이후 구글의 제미나이, 중국의 딥시크, 네이버의 클로바까지, 인공지능은 어느덧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딥시크는 고가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성능을 구현해 글로벌 AI 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반면 네이버의 클로바는 국내 데이터와 언어 환경에 특화돼 있어 한국인에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관세, 핵추진 잠수함 등 굵직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은 미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장밋빛 청사진은 순식간에 냉정한 현실 앞에 멈춰 섰다.
AI 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은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11년 전, 강원도 춘천시는 네이버가 연구소와 연수원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지역의 기대감이 컸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수십억 원의 세제 감면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춘천에 들어선 것은 고용효과가 미미한 데이터센터였다. 400~500명의 고용을 기대했던 지역은 실제로 150명 내외의 일자리만 얻었고, 데이터센터 특성상 대부분은 기술 관리 인력이었다.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대규모 전력 소비만 남겼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은 낮은 기온과 풍부한 수자원 덕에 냉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은 지역 주민보다는 기업에 집중되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구봉산 일대의 공시지가는 14년 만에 54배 상승했지만, 정작 춘천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서울 본사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현재 경기 시흥 장현지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유치를 두고 주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전기만 먹는 괴물”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개발이라면 아무리 첨단산업이라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제는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딥시크를 개발했듯, 한국 역시 국산 AI 반도체인 K-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오픈소스화로 고가의 GPU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Gemma, Mistral, LLaMA 3, DeepSeek 등 오픈소스 AI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AI 생태계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 중이다. 이 변화 속에서 국내 NPU 기업들이 AI 인프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AI 시대의 주도권은 ‘하드웨어의 독립성’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나라가 쥐게 될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굳이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전력과 냉각 비용이 적게 드는 산간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충분하다. 다만 지역경제와 고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AI 독립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가 KF-21 보라매 전투기와 AESA 레이더를 자력으로 개발했듯, AI 인프라 역시 우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듯, AI 역시 ‘자립’이 핵심이다.
AI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전북과 군산이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기계의 불빛만 남는 도시가 될지, 아니면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AI 독립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