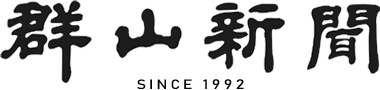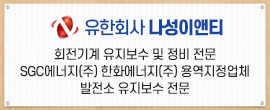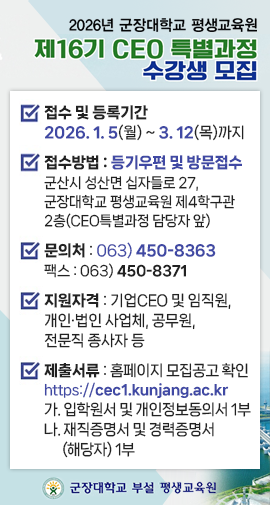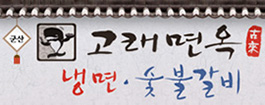◇최규홍 전 군장대학교 명예교수(전북문인협회 회원)
채만식의 부친 채규섭(1862-1945)은 소년시절에 매우 곤궁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글공부를 착실히 했다.
서당의 학채를 내지 못해 구박과 눈치를 받으면서도 이곳저곳 서당을 전전하며 공부를 했다.
부친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평생을 집념으로 살며 가산을 모았던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5남 1녀 자녀에게 일찍이 상속을 마치고 무병장수(83세)의 여생을 보냈다.
채만식의 맏형 명식은 말이 능숙해서 별명이 변호사였다. 한량 기질이 있고 놀기를 좋아해 부친이 모은 가산의 일부를 소진해 버렸다.
셋째 형 준식은 멋모르고 금광에 손을 대어 가산을 탕진하고, 넷째 형 춘식은 선린상고를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금광 일에 합류를 했다.
1922년 3월 중앙고보를 졸업한 채만식은 그해 4월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고등학원 문과에 입학 후 1년 6개월 만에 귀국했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대학살과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퇴했다.
귀국 후 강화의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이 되고, 단편 ‘세 길로’가 이광수에 의하여 조선문단에 발표되었다.
1925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다음해 사직했다. 개벽사에 근무(1931-1933년) 후 조선일보사에서 기자로 근무(1933-1936년)했다.
‘탁류’는 채만식이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마치고 개성에 살고 있는 넷째 형 춘식의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 쓴 작품이다.
1937년 8월 개성에서 탈고 후 1937년 10월부터 1938년 5월까지 198회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삼천리 방방곡곡 광산을 뚫는 곡괭이질 소리가 요란했던 ‘골드 러쉬’가 한창이었을 때 김제 금구광산에서는 1902년부터 금을 채굴했다.
또 금산사에서는 금을 채굴하기 위해 사찰구역 내로 채굴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자 덕대(德大)라는 직책의 채굴권을 얻은 채굴자가 각민스님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금산사 일대는 농경지마다 사금(砂金) 채굴로 유명했던 곳이다.
채만식은 1933년 황금열풍을 비판했으나 채만식이 김제, 천안 일대의 광산개발에 뛰어든 때는 ‘탁류’, ‘태평천하’의 집필을 마친 1938년이었다.
그때 채만식의 두 형들은 사금광 시추 전문가가 되었다. 월급쟁이로 광산을 떠돌던 형들이 1938년 여름, 청주 화당리의 남택광업에서 보링작업을 돕다 금광개발권 일부를 불하받았다.
형들이 잡은 천운의 기회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금광꾼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금광 개발자금 2,000원이 필요해 몇 달을 돌아다녔으나 헛수고만 했다.
천신만고 끝에 1938년 11월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 설의식(1900-1954)을 전주로 유치했다.
혹한기에 금 캐기에 몰두했으나 허탕을 쳐 설의식에게 5,000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말았다.
채만식은 오죽이나 면목이 없었던지 친구 설의식을 차마 찾아갈 수 없었다.
채만식이 빚만 지고 실패했던 금광꾼 경험은 노다지 열풍상을 글로 남기는데 유익한 점도 있었다.
매일신보(1939.1.28.-1939.11.19.)에 연재된 장편소설 ‘금의 정열’, ‘인문평론(2권 2호)’에 게재된 ‘금과 문학’(1940. 2.), 조선일보에 게재된 ‘대하를 읽고서’(1939.2.7.-8.)는 금광꾼 경험이 바탕이 되어 물질만능주의와 황금광 시대를 풍자한 것이다.
두 형들을 따라다니며 금광에 투신했던 경험을 살려 쓴 것이어서 금광의 지식이 바닥에 용해되어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미쳐 있듯이 채만식도 금광(金鑛)에 미쳐 금광(金狂)이 되어 있었다.
<외부칼럼은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